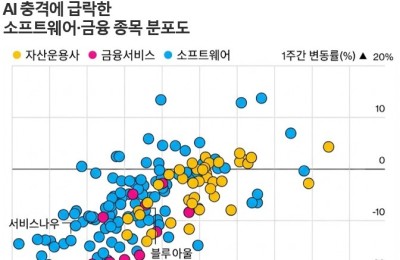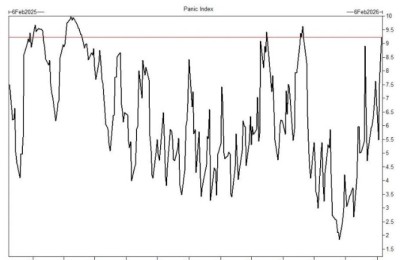[뉴스핌=양진영 기자·사진=강소연 기자] 뮤지컬과 드라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달려온 엄기준(38)은 소문난 워커홀릭이다. OCN 드라마 '더 바이러스'와 뮤지컬 '삼총사' 공연 병행 끝에 그는 살이 쏙 빠진 얼굴로 나타나 그간의 피로를 짐작케했다.
지난 5월7일 '더 바이러스' 종영후 까칠남 엄기준을 압구정동의 카페에서 만나 남다른 뮤지컬 사랑과 연기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엄기준은 쉼없이 달려온 여정을 끝내고 모처럼 여유를 찾은 듯 했다. 극중 이명현 반장의 인간적 매력에 더없이 끌려 '더 바이러스'를 선택하게 됐고, 이 작품은 무엇보다 엄기준의 연기력을 더욱 빛나게 해줬다.
엄기준은 촬영 당시를 떠올리며 "춥고 배고팠다"며 웃었다. 1주일 중 이틀은 뮤지컬 '삼총사' 공연이 있어 남은 닷새 동안 50분 분량을 찍어야 했다. 그는 "극중 브리핑 장면이 많아서 대사도 엄청 많았어요"라며 그간의 고생을 여실히 드러냈다. 열린 결말로 끝난 '더바이러스'의 시즌2 출연 가능성을 두고는 "야식 주면 찍을래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사실 엄기준은 '더 바이러스' 이명현과 닮은 점이 많다. 성격이 급한 것과 한 가지에 무섭게 파고드는 집념 가득한 점이 그렇다. 또 '그들이 사는 세상'의 손규호 캐릭터처럼 까칠한 면도 있단다. "가끔 까칠하게, 혹은 자상하게 굴어줘야 할 것 같은 지인들이 꼭 있어요. 그들은 절 '까칠 엄'이라고 불러요.(웃음)"
브라운관에서도 인상깊은 연기를 선보였지만 엄기준 이름 석자로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건 뮤지컬에서였다. 혹독하기로 이름난 드라마 스케줄 속에서도 병행할 정도로 공연에 애착을 지닌 이유는 뭘까?
그는 "직접 무대에서 관객들과 호흡을 하니까 재미있고, 선배들과 같이 공연하니까 연기적으로도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뮤지컬만의 매력이 있죠"라고 설명했다.
특히 팬들의 뇌리에 가장 뚜렷이 남은 작품은 뮤지컬 '헤드윅'이다. 자칭타칭 '엄드윅'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럼에도 헤드윅은 그에게 가장 어려웠고, 아쉬움이 남았던 역할이다. 배우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성소수자'의 연기는 언제나 상상만으로 그리기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에 반해 가장 좋아했던 작품으로 엄기준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꼽았다.
"베르테르 역할은 세 시즌 연속으로 연기했는데, 첫 시즌 때는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하나?' 싶었어요. 이해가 안됐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정말로 베르테르에 완전히 몰입하고, 공감했어요. '이래서 죽는구나'하고 느꼈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뮤지컬 무대에서 잔뼈가 굵었으니, 이쯤되면 노래 실력에 자신이 생겼을 법도 하다. '2옥타브 라(A)'까지의 음역을 소화하는 그는 아직도 겸손을 떨었다. "자신 있는 건 아직도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실연남녀'라는 작품에서 불렀던 '단 한 번만'이라는 곡이에요. 가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부를 때 정말 좋아해요."
연기밖에 모르고 달려온 외골수 엄기준는 어느새 혼기가 꽉 찼다. 그는 어머니의 은근한 결혼 독촉을 받는다며 "올해 여자친구를 만나서, 내년에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밝혔다. "이상형은 박보영씨지만, 결혼 상대로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여자가 좋아요. 제가 평소에 의외로 어리숙해서 저보다 더 똑똑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었던 '투잡'을 마무리하고, 그는 영화 '더 웹툰'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남은 올해는 뮤지컬 공연에 올인할 작정이다. 항상 뒤에서 지켜주는 팬들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전회 공연을 관람해주는 고마운 팬들을 언급하며 살짝 걱정을 하기도 했다. "굉장히 감사하고, 제 공연으로 힐링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적금은 깨지 마세요.(웃음)"

마지막으로 가장 '엄기준 다운' 포부를 밝혔다. 이름 석 자만 보고도 믿음직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것. 한 우물만 우직하게 파는 '까칠 엄'이지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연기자로서 진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국내에서는 점점 더 초연 뮤지컬이 드물어지는 추세인데, 초연으로 올리는 공연에도 '엄기준'이라는 이름만으로 관객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배우. 이게 제 목표이고, 꿈이에요."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