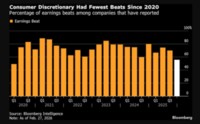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올해 초까지 4년 가량이나 인기를 끈 공중파 TV 프로그램이 있다. '남자의 자격'이란 예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의 자격'이란 말도 유행했다. 인기를 끈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유행어는 생뚱맞게 술집 간판에 쓰여 있기도 한다. 친근해졌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 '자격'이란 말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불편했다. '자격'이란 말이 묘하게 그걸 보거나 듣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네가 그럴 자격 있어?"라고 취조 당하는 듯한,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나" 머리 싸매게 되는 말이란 얘기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이 '자격'이란 건 참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자격'에 맞춰 책임감있게 살고 있는지, 내가 책임을 다 못해 누군가에게 혹시나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차원에서도 필수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느냐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존재인 이상 '나'의 행동과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회사가 잘 나갈 땐 가려질 수 있지만 실적이 악화되고 비전이 보이지 않으면 비로소 리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평가가 난무한다. "생각보다 괜찮으니 믿고 따라가 보자"라고 판단되면 '오케이'다. 리더를 중심으로 회사가 단결할 기회가 된다. 하지만 악평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다르다. 리더가 바로 문제의 근원일 수 있다. 소셜 게임업체 징가의 CEO 마크 핀커스는 후자의 경우다.

지난 2007년 세워진 징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을 업고 멀미가 날만큼 급성장했다. 주가도 치솟았다. 핀커스 CEO의 부(富)도 급팽창해 2011년엔 포브스 선정 '전 세계 400대 억만장자' 리스트에도 들었다. 당시 그의 개인 자산은 2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징가의 주가는 낙하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과의 관계도 청산됐고 인기 게임은 표절 시비로 소송이 붙었다. '팜빌'에 대한 사용자들의 열광은 식었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게임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CEO는 개인 욕심을 알뜰히도 챙겼다. 말도 바꿨다. 상장 직전에 직원들에게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없던 일로 만들어 놓고선 자신은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매매정지(lock-up)가 풀리자 마자 주식을 내다팔아 지갑을 불렸다. 1650만주, 전체 지분의 16%에 달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추락했던 주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기업공개(IPO) 공모가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선 "징가의 좋은 시절은 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핀커스 CEO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돌았다. 직원들에게 "능력없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독선을 뽐내는가 하면 "혁신따위는 필요없다"고 말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면서 너무 사소한 일까지 간섭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를 참아줄 사람들이 줄어갔다. 핵심 인력들은 계속 유출됐다. 그건 회사가 망해간다는 시그널이다.
핀커스 CEO는 지난해 다트머스대 경영대학원(터크 스쿨)이 '올해 최악이었던 5명의 CEO'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는 '창업자가 탐욕을 부린 예(founder overreach)'로 징가와 핀커스를 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도 물러나기로 했으니 다행인가. 어떤 매체에선 이걸 두고 '테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BTIG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리처드 그린필드는 "직원들의 사기가 지난 18개월 동안 최악의 수준이었다"면서 이걸 변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관건이라고 했다.

'CEO의 자격'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이사회가 밀어서 그냥 생기는게 아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믿고 따를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생긴다. CEO가 그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의 존재 목적인 이윤 추구도 불가능하다. CEO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 엄밀하게는 오너와도 다르다.
'엄살'도 전략적으로 피울 때 효과가 있다. "상황이 계속 어려우니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만 강요하면 조직원들은 지친다. 어느 정도 미래를 향해 열린 희망이 보여야 당장 어렵더라도 참을 수 있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는 리더를 계속 믿고 따르긴 어렵다.
그런 얘긴 수요 예측부터 잘못해 놓고 애먼 국민들에게 "전기 아껴쓰라"며 마치 국민들이 전기를 펑펑 써서 전력난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정부와 다를 바 없다. '괜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리더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나라를 경영하거나 작은 조직을 경영하거나, 경영자라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결국은 책임의식의 문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