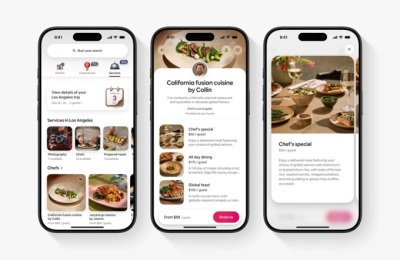군납ㆍ소시지공장 납품 노계는 예외..노출 가능성
[뉴스핌=전지현 기자] '살충제 계란'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닭고기 안전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나서 살충제 계란 파문은 식용 닭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동물축산 관련 전문가들은 18일 식용으로 사용하는 닭은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은 "육계는 30일 정도만 키운 뒤 출하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진드기나 이 등 각종 해충을 잡기위해 사용된 농약성분이 원인인데, 삼계탕, 치킨 등 먹는 닭을 키우는 육계는 닭을 키우는 산란계와 사육방식이 달라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손 소장에 따르면 산란계는 작은 케이지에서 3~10마리를 한데 모아 밀집사육한다. 이 때문에 몸에 붙은 진드기를 떼어낼 만큼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 진드기는 낮에는 케이지 사이, 갈라진 벽의 미세한 틈새에 있는 먼지 속에 숨었다 밤이 되면 이동·흡혈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가 크다.
반면,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은 데다 주로 비교적 넓은 평사(바닥에 만든 닭장)에서 방사해 키우기 때문에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손 소장은 "'닭에는 무조건 진드기가 있다'로 인식하면 안된다. 진드기가 살수 있는 조건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육계 사육 구조물이 자체가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육계가 안전하다는 주장은 학계의 의견과도 일치했다. 농가들이 산란계에 살충제를 샤워하듯 뿌리면서 사료가 오염됐고, 계란에 흡수됐다는 관점도 같았다. 그러나 학계는 살충제 성분 사용여부보다는 이 성분이 다른 상태로 옮아가는 속도를 이유로 꼽았다.
김계웅 공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사료를 통해 흡수된 독성은 혈액을 통해 바로 전해진 뒤 단백질로 합성된다"며 "이 때 합성 이행 속도 순서는 계란→우유→고기 순이다. 계란으로 합성되는 성분 속도는 닭에 비타민을 주면 바로 알에서 이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동물에는 외부 기생충이 살고있다. 하지만 같은 살충제를 사용하더라도 산란계는 모이를 먹는 즉시 이행 속도가 빠른 계란으로 전이되는 데다 오래 키워 알을 낳기 때문에 축적될 수 있다"며 "반면 육계는 사람이 이행속도가 가장 느린 고기성분으로 섭취하고 단기간에 도축하기 때문에 산란계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산란계 가운데 나이가 들어 더는 알을 낳지 못하는 ‘산란노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산란계는 태어난 지 20개월이 지나면 생산력과 경제성이 떨어져 고기용으로 처리된다.
산란노계는 대형마트 등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지만, 군납, 가축사료, 소시지 생산 공장으로 납품되거나 베트남 등 동남아로도 수출이 이뤄진다. 노계는 긴 사육기간으로 1~1.5kg 안팎인 육계에 비해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소규모 음식점이나 일반 재래시장에서 유통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블로그 상에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크기가 큰 닭을 시장에서 구입, 삼계탕을 만들어 먹었다는 글이 많았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통상 산란 성계를 노계라고 표현한다"며 "일반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노계들은 산란계 노계가 90%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