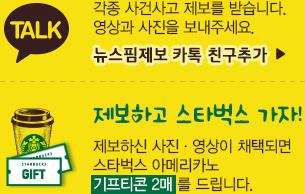[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폐광지역 탄전·탄광문화연구소가 최근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업인의 날' 제정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영월·정선·보령 탄광·산업문화연구소와 탄전문화연구소,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등은 "'광업인의 날' 제정 법안은 광부들의 희생과 영예를 제대로 기리기보다는 경영자들만을 위한 날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석탄산업을 위해 희생한 것은 광부들이었고 자본 축적은 탄광 경영주가 독차지 했는데도 경영주를 위한 '광업인의 날'까지 제정하는 것은 석탄합리화보다 더 충격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여섯가지 근거를 들어 '광업인의 날' 제정을 반대했다.
먼저 '광업인의 날' 제정일을 광업법 제정·공포일인 12월 23일로 삼았는데 이 광업법은 광산의 경영과 자원의 개발을 규정하는 법률로 광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는 경영자들에게 유리한 법적 틀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사회에서 '광부'와 '광업인'은 명확히 구분돼 사용됐으며 '광업인'은 기업인, 탄광 경영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라는데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로는 탄광 사고를 다룬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보듯이 탄광노동자를 칭하는 명칭은 '광부'이며 광부들은 지난 1970년을 전후해 매년 180명이 넘게 사고로 순직하며 목숨을 잃었지만 '광업인'이라 불리는 경영자들은 한 명도 순직하지 않았다. 이는 광부들의 명칭이 지난 무게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는 지난 1980년대 정부는 광부를 '광산근로자'로 바꿔 부르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이 정책이 실패하자 '광원'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국립국어원은 '광원'을 '광부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광원'에서 알 수 있듯이 광부는 '광업인'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번째는 탄광 경영자들도 광부들을 '광부'라 칭하며 그들의 노동을 존중했으며 실제 광부 인력이 부족했던 당시 민영탄광이 대한석탄공사에 광부를 빼앗기자 항의 서한을 정부와 석공에 발송하면서 '광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광업인'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경영자들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여섯번째로 국립국어원은 '광부'를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면서 '광부와 광업인'을 분리 표기하고 있는데도 광부의 명칭을 '광업인'으로 희석시키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쟁준비에 몰두했던 일제강점기에도 광부들을 '산업전사'라고 불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석탄 증산을 위해 '산업전사'라고 추켜세웠다. 1950년~1960년대엔 '탄광모범산업전사' 대회가 열렸으며 1970년대엔 '산업전사위령탑'이라는 글자를 대통령이 직접 써서 탑신에 새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언어의 역사적 계승 측면이 있는데도 산업전사라는 영예는 고사하고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광부들의 역사적인 희생과 영예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 단체는 '광업인의 날' 제정에 반대하며 '광부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