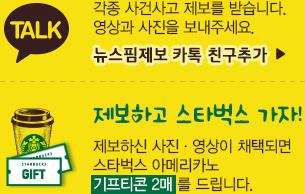지자체 위임 관리 권한…인력 부족 등 책임 소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과도하게 위임돼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39곳, 면적 3124.7㎢로 서울의 5.1배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은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이 지난 4월부터 전국 해양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90% 이상 구역에서 해양쓰레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불법어업과 폐어구, 관광 쓰레기 투기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보호구역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직접 개입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해역을 담당하며 주민에게 수거 부담을 돌리고 있다.
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해양폐기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지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단속과 수거사업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 사실상 지자체 중심의 실행 구조를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체계의 한계 속에 예산마저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은 2023년 121억 원에서 2025년 6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해양환경공단의 민간대행 예산도 2022년 8.1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해수부와 공단은 조 의원실의 질의에 "보호구역이 위치한 지자체가 자체 수거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답변해 중앙정부 관리의 실질적 역할이 부재함을 인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현재의 지자체 의존형 체계로는 2030년까지 보호구역 비율을 30%로 늘리겠다는 국제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중앙 주도의 통합 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