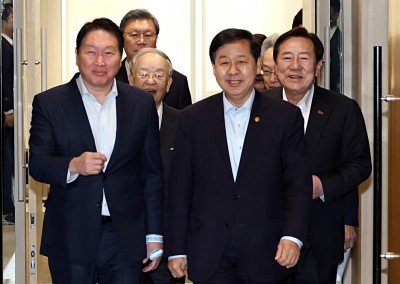[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으로 이름을 알린 알테오젠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현금배당 소식을 알렸다. 총 규모는 200억원으로 회사 성장에 따른 성과를 주주와 나누겠다는 취지다.
알테오젠의 이같은 행보는 단순한 주주가치 제고의 성격을 넘어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 기업이 현금배당에 나서는 일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신약 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적자 구조는 바이오 기업의 숙명처럼 여겨졌다. 기술력 하나로 미래의 꿈을 파는 산업이라는 인식도 존재했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과 동떨어진 사업에 뛰어든 바이오텍들도 적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 기업은 신약 임상 실패와 법차손 규정에 쫓긴 끝에 미국 가상자산 헤지펀드에 인수돼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엉뚱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재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상폐 수순을 밟은 곳도 있다. 바이오 업종의 R&D 현실과 상장사 규제가 요구하는 기준이 어긋나면서 규제를 피하려다 기업가치가 훼손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알테오젠의 사례는 국내 바이오 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에서 수익 창출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익과 제품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등이 쌓이면서다.
상장 원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에임드바이오다. 상장 첫해 매출은 47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0% 증가했고, 20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독자적인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베링거인겔하임 등 글로벌 빅파마와 체결한 굵직한 기술이전 계약의 선급금과 마일스톤 등이 실적에 반영된 결과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첫 해부터 흑자를 낸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에이비엘바이오 역시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바디'를 앞세워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금이 실적에 기여했다.
이들 기업은 기술이전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반복 가능한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가고 있다. 물론 바이오 산업의 본질은 여전히 R&D 중심이고, 신약후보 물질의 상업화 여부는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도전은 이어가되, 그 결실이 수익과 주주환원으로 이어질 때 산업에 대한 신뢰도 함께 자란다. 알테오젠이 연 변화의 문을 더 많은 바이오 기업이 이어가길 기대한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