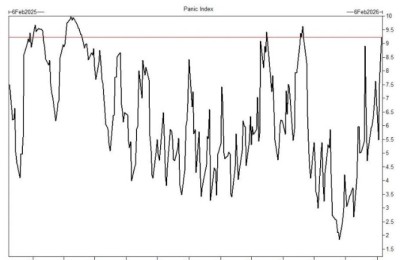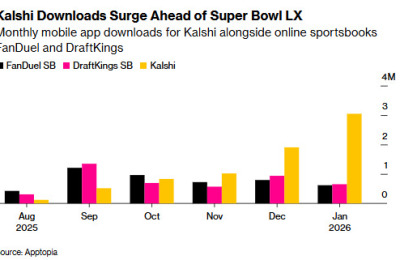[뉴스핌|부산=장주연 기자] “사람들이 본다니까 떨린다”는 최우식의 말에 “영화를 보여주려고 만들지. 개인 소장하려고 만드느냐”고 초를 치는 이는 김태용. “영화가 무거울까 걱정”이라는 김태용의 우려에 “무거우라고 만든 거 아니야”라고 핀잔을 주는 건 최우식이다.
그러다가 좀 그럴싸한(?) 대답을 했다 치면 “나이스 멘트~”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한다. 친구인지 친형제인지 모르겠는 이 둘의 사이는 감독과 배우다. 이렇게 쿵작이 잘 맞으니 다음 작품도 같이 하면 되겠다는 말에 “내 마음대로 되나. JYP(최우식의 소속사)와 오까네(돈)를 맞춰봐야겠다”며 마주한 김태용(27) 감독이 환하게 웃었다.
김태용 감독이 고향 부산을 찾았다. 한 손에는 신작 ‘거인’을 들고 한 손에는 최우식의 손을 잡았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한국 영화의 오늘-비전 섹션에 초청된 ‘거인’은 무책임한 부모의 집을 떠나 스스로 그룹홈 이삭의 집에서 살며 성장통 보다 인생의 고통을 먼저 알게 된 열일곱 소년 영재(최우식)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담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BIFF는 자주 왔죠. 여러 유럽 영화들 보면서 ‘영화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다짐했는데 딱 10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것도 첫 장편으로 오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해요.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고 영화 보고 계란 세례만 안 맞았으면 좋겠네요(웃음).”

이번 영화는 김 감독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장편 영화이자 열 번째 작품인데다 BIFF에도 초청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주인공 영재와 그가 많이 닮았다는 데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영재에게는 김 감독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고해 프로젝트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실제 김 감독은 아버지를 벗어나 그룹홈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신부님이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아등바등 힘들게 살았던 철없던, 그리고 누구보다 아팠던 시절이다.
“서른이 가까워오면서 많이 털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있나 봐요. 사실 촬영 끝나고 화가 나서 술을 엄청 먹은 날도 있어요. 영화는 영화,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겹쳐 보인 시점이 온 거죠. 영화 중반부쯤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재현해야 한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상 개봉을 앞두니 수치스럽기도 하네요. 시놉시스 쓰고 촬영할 때도 괜찮았는데 이제 오니 뭔가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죠. 고향에서 첫 상영을 앞둬서 더 그런가 봐요(웃음).”
그의 첫 번째 고해 프로젝트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아마도 시종일관 부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에 있다. 한 소년의 성장담이지만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인물도, 원인도 모두 아버지다. 물론 이 역시 김 감독의 이야기가 묻어난 부분이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해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안 그럴 때가 오겠죠. 하지만 요즘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극단적인 무책임한 아버지의 형태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일직선상에서 봤을 때 같은 남자, 같은 사람으로서의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싶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아팠던 그의 어린 시절은 최우식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났다. 촬영부터 후반 편집까지 꽤 오랜 시간 자신을 닮은 최우식의 모습을 지켜봤다. “자연스레 동일시하게 됐다”던 그는 서운한 마음에 최우식이 출연하는 드라마도 못 보겠노라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내 “그래도 최우식과 작업한 건 감독으로서의 프라이드”라며 환하게 웃었다.
“새로운 연기를 하는 인상 깊은 신인 배우를 관객에게 소개했고 배출했다는 거에 감독으로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최)우식이가 캐릭터를 끌고 가는 힘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민한 톤의 영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보죠. 개인적으로는 3년 안에 다른 작품을 또 해봤으면 하고요. 얘가 갖고 있는 10대의 밝은, 그러면서도 그늘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교복을 못 입기 전에(웃음) 힘 있는 작품으로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는 참 많이 웃었다. 상대를 웃기는 말 재변도 보통이 아니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유쾌함 뒤로 쓸쓸함이 묻어났다. 벌써 차기작을 쓰고 있는 이유 역시 조금이 이 작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화로 아픔을 지닌 이들의 마음이 치유됐으면 하는 김 감독의 바람이 어쩐지 간절해 보였다.
“성장영화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 동료의식을 갖는 지점이 있었으면 해요. 움찔움질하찔 만드는 지점이랄까(웃음). 개인적으로는 ‘한공주’, ‘도희야’와 비슷한 영화라 생각해요. 두 영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영재를 어떻게 책임져줘야 하나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해요. 사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세상은 아이들을 책임져줄 수 없는 지옥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이 많이 봤으면 해요. 그리고 더는 상처를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치유하길 바랍니다(웃음).”
[뉴스핌 Newspim] 부산=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