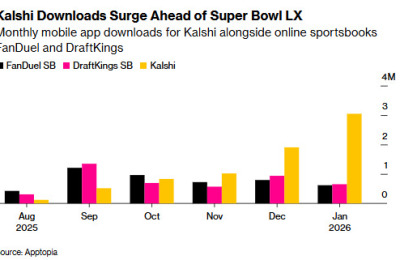|
[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이형석 기자] 영화 ‘대호’ 속 칠구를 보고 있자면, 솔직히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다. 만덕(최민식)처럼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구경(정만식)처럼 목적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구태여 설명을 하자면 살기 위해 사는 인물 같다고 할까.
하지만 그렇기에 산을 누비는 수많은 포수 대원 중 칠구에게 가장 눈길이 간다. 실제 칠구는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평범한 이들을 제일 많이 닮았다. 동시에 누구보다 솔직한 인물이자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 줄 안다. 즉, 가장 인간답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물론 이 캐릭터가 이토록 사실적인 옷을 입고 다가오는 데는 배우 김상호(45)의 공이 크다. 김상호가 지닌 특유의 자연스러움에 힘입은 것. 김상호는 칠구가 과장되거나 의미 없이 소비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사람이 포수가 됐어요. 좋다 싫다를 떠나서 살아야 하니까. 칠구는 그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살아야 하는 'ing' 인물이랄까요. 물론 (정)만식이나 (최민식) 선배처럼 플롯이 확실하진 않죠. 근데 제가 시나리오 받기 전부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생각해봤어요. ‘대호’ 시나리오 속 칠구에 제 생각이 딱 투영된 거죠. 살아야 하잖아요.”
 |
김상호는 칠구를 “속은 누구보다 뜨거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훗날 칠구의 삶에 대해서는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해서라도 “또 다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포일러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일이 있었기에 예전만큼 활기차게 살지는 못했을 거라 덧붙였다.
“맨 처음 시나리오 읽고 칠구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고 감독님 만나고 리딩하고 현장 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캐릭터를 만들어갔고요. 중간을 잘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상의도 많이 했죠. 대사를 빼거나 넣거나 하면서요. 또 이 장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고민하고 리액션에도 신경을 기울였어요.”
이미 알 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대호’의 촬영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다. 지리산과 설악산, 완도, 남원, 제천, 대관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칼바람과 맞섰다. 제작진은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고 배우들은 눈 덮인 산을 오르며 촬영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김상호는 이를 즐겼다. 유일하게 산책하듯 산을 올랐다는 이가 바로 김상호다.
 |
“물론 추웠죠. 로보캅처럼 핫팩을 온몸에 다 붙였어요. 근데 새벽이 되면 열기가 식어서 차가워지더라고요. 신발도 미끄러워서 걷지도 못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오히려 재밌었어요. 운동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또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견딜 만해요. 되레 표현하고 싶은 연기가 잘 안될 때, 익숙한 표현이 나올 때 힘들죠. 스스로 창피하고 속상하니까.”
이러한 심적, 혹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건 단연 동료들 때문이었다. 특히 김상호는 최민식, 정만식은 물론 자신의 뒤를 묵묵히 지키고 따르던 포수 대원들도 챙기며 서로를 의지했다. 이는 영화 속 생활 반장 칠구와 겹치는 부분이다.
“앞에 인물들이 아무리 잘해도 뒤에 사람들이 딴짓하면 끝나요. 더군다나 우리 포수 대원들 배우들이 다 잘했어요. 각자 사연이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뛰니까 그림이 되는 거죠. 대단했어요. 같이 숙소에서 바비큐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친해졌고요. 다들 한가락하는 놈들이라 서로의 연기를 말하기보다 사는 이야기 하고 논 거죠. 즐거웠어요(웃음).”
 |
포수 대원 중 한 명인 그에게 숱한 해석을 낳고 있는 ‘대호’ 속 호랑이의 의미도 꼭 물어보고 싶었다. 칠구는 물론, 김상호라는 사람에게 호랑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했다.
“어떻게 해석해도 좋을 듯해요. 어떤 상상도 다 맞죠. 다만 칠구한테 호랑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고 김상호한테 호랑이는 안타까움이죠. 최후의 호랑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놔서 그런지 마지막이 소멸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켜줘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마지막 질문은 역시나 ‘대호’와 한날한시에 맞붙은 ‘히말라야’와 경쟁과 관련된 것. 특히 ‘대호’와 ‘히말라야’는 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 사람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제법 닮았다.
“이게 정말로 그렇대요. 물건을 팔 때 한 가지만 내놓고 선택하는 것보다 좋은 두 상품을 내놓았을 때 선택받는 확률이 더 크다네요. 절대적인 한 제품만 놔두는 편보다 나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기죠. 경쟁작이 아니라(웃음).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심정은 선택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 본다면 실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