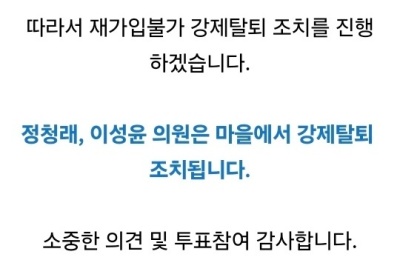낯선사람 뭐라 불러야 할지 난감, 기준은 ‘오직 나이’
자신의 존대와 상대의 반말로 계급 형성, 수직의 굴레
[뉴스핌=김규희 기자] 우리는 질문하기 어려운 한국사회에 살고 있다. 어떨 때는 질문이 나에게 부메랑이 된다. 윗사람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하고, 때론 어처구니 없는 질문으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럴 바에야 입닫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야!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내가 뭐라 답변하니?” (나이 많은 사람)
“아니 ‘야’라고 하실건 아니고요.” (나이 적은 사람)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는게 뭐가 나빠!” (나이 많은 사람)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오는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72)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한 말이다.
우리말은 ‘높이는 말’이 발달했다. ‘반말’도 발달했다. 존댓말과 반말이 어우러지는 순간 계급과 위계질서가 만들어진다.
김평우 변호사는 젊은 기자를 눈 앞에 두고 ‘야’라고 외치는 순간 이미 언어적 계급이 형성됐다. 반말은 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기자도 김 변호사와 같이 반말로 응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봐도 뻔하다.

◆ 반말과 존댓말, 생활환경의 산물
우리는 연장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보편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우리가 용인하는 범위에서 상하관계가 형성됐을 때 의사 소통 과정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어긋나면 충돌한다.
언어사회학자인 이병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우리말을 ‘마을공동체 언어’로 해석했다. 산업화 과정을 겪기 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는 생활의 터전은 항상 일정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랐던 어른과 관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나 어법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이제 과거 같은 좁은 생활권은 없다.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반말을 하는 경우도 과거보다 훨씬 줄었다. 같은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지금의 생활권을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먼훗날 더 이상 반말이라는 언어체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 유교문화 속 ‘자발적 굴복’
김성수(40·가명)씨는 자기보다 어린 후배와 직급이 같다. 후배는 매번 자신에게 존댓말을 써왔지만 직급이 같아지고 나서는 반말을 섞어쓰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그때부터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불편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반면 회사의 상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하면 오히려 불편해하기도 한다. 상사의 권위에 대한 ‘자발적 굴복’이 알게 모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리는 윗사람 말에 절대복종해야 하는 유교 문화에서 성장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했다.
삼강오륜의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존중해야 옳은 것이었다.
정도는 옅어졌지만 유교의 기본 강령은 오늘날까지 진리처럼 여겨져 내려왔다. 때문에 우리는 존댓말과 반말의 계급언어 체계에 속하는 순간 벗어날 수 없는 ‘수직’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언어’는 그 사회의 체계와 문화를 나타내는 단면이다. 언어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는 어휘와 문법 요소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우리말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슬프게도 ‘상하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도 모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