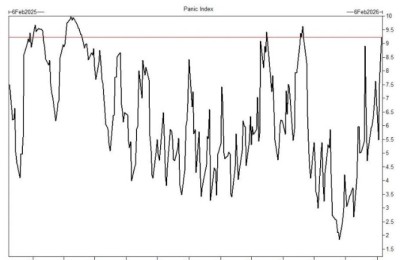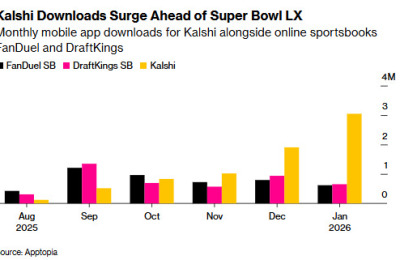[뉴스핌=장윤원 기자] 올 겨울 대극장을 점령한 굵직한 뮤지컬을 보고 있자니 있어야 할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간 뮤지컬 ‘레미제라블’ ‘노트르담 드 파리’ 등 내로라하는 작품에 등장해 무대를 주름잡았던 문종원. 그가 올 겨울에는 소극장 연극으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9월, 내레이터 역으로 출연했던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를 마치고 차기작으로 선택한 것이 연극 ‘맨프럼어스’다. 사실 문종원은 ‘블러드 브라더스’를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질 계획이었다. 제의가 들어왔던 뮤지컬들은 미리 정중히 고사하고, 깔끔하게 마음의 정리를 해놨던 차. 한 통의 전화가 그를 대학로 무대로 이끌었다.
“‘맨프럼어스’의 최용훈 연출님, 이형주 음악감독님과 이전에 같이 작업한 적이 있어요. 그 때 ‘기회가 되면 다시 뭉치자’는 말을 했었는데, 그 동안 뮤지컬 쪽 일로 바쁘다 보니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출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이런 작품을 들어가는데, 같이 하자고. 잠시 활동을 쉬기로 한 것도 나름 용기내서 결정했던 건데(웃음) ‘맨프럼어스’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맨프럼어스’를 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텍스트 자체의 재미, 그리고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 특히 문종원은 작품이 주인공 존 올드맨에만 치중돼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주·조연의 유기적인 조화가 대단한 작품이기 때문에 탄탄한 선배들과의 호흡이 주는 가르침이 컸다”고 말한다. 많이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지금 돌아보더라도 참 감사한 기회였다.

연극 ‘맨프럼어스’는 역사학 교수 존 올드맨(문종원 여현수 박해수)의 송별회를 비추며 시작한다. 동료 교수들은 갑자기 떠나는 존의 속사정을 궁금해하고, 존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스스로를 1만4000년 동안 살아온 불멸의 남자라 주장하는 존과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교수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진다.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는 ‘1만4000년이나 살아온 사람’에 치중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았다면 어떨까도 많이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존 올드맨의 그런(‘불멸’에서 비롯되는) 내공을 보여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연이 말하려고 하는 건 결국 ‘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종원은 바로 이전 출연작 ‘블러드 브라더스’에서는 내레이터로 분해 무대 위 상황 묘사나 인물의 내면을 설명하는 역할을 소화했다. 완전히 전지적 입장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뭘 해도 괜찮았던 ‘내레이터’와 달리, ‘존 올드맨’은 긴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야 비로소 존의 인간적 면모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사실 ‘블러드 브라더스’는 완전히 전지적 입장이라 뭘 해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무대에서 굴러다녀도 될 정도였죠. 그야말로 ‘시간의 바깥’에 있는 캐릭터라고 할까. ‘맨프럼어스’의 존 올드맨은 오히려 긴밀함을 유지해야 하는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면을 살펴보면 시간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각 장면만 본다면 “(전개와 상호관계에 있어)굉장히 유기적으로 가야 했어요.”
작품 전체로 봤을 때 존 올드맨은 ‘시간의 바깥’에 있는 게 분명하지만, 그 남자가 말하고 행동하는 매 순간만큼은 우리와 같은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이 문종원의 해석이다.
“존으로서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고독이 묻어나는 포인트들은 놓치고 순간순간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존이 전혀 쓸쓸한 사람이 아닌 채 끝나더라고요. 존이라는 사람의 가치, 이 사람만의 특별함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해요. 그게 고독이 될 수도 있고, 신적 존재감일 수도 있고요.”

대개의 경우 굵직한 대형 뮤지컬에서 만날 수 있었던 문종원을 객석과 무대의 거리가 한층 가까운 소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대극장은 그것 만의 묘미가 있지만, 지금 그는 ‘맨프럼어스’를 하면서 소극장 무대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소극장의 경우엔 쉬지 않게 돼요. 집중이 치밀해진다는 의미에요. 그런 점은 배우로서 고마운 부분이죠. 또, 온전히 연기에 집중하다 보면 관객들이 무대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재미있어요. (무대 위)우리의 순간에 관객들이 끌려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숨 안 쉬면 관객들도 숨을 안 쉬어요. 그런 순간들!”
문종원은 지난 2003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한 이후 ‘사운드오브뮤직(2005)’, ‘맨오브라만차(2007)’, ‘노트르담 드 파리(2009)’, ‘아이다(2010)’, ‘레미제라블(2012)’ 등으로 매 해 꾸준히 무대에 서 왔다. 그런 그가 비로소 느낀 배우로서의 사명감을 털어놓는다.
“배우로서 가야 할 길을 정한 건 최근 몇 작품을 하면서예요. 메신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주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교화든 감동이든 뭔가를 느끼게끔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맨프럼어스’도 그렇고 바로 전작인 ‘블러드 브라더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라는 직업이 제게 책임감처럼 다가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고민해야 되는 건 작품의 장르·역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작품을 통해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가’가 아닐까요?”
[뉴스핌 Newspim] 글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사진 올라운드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