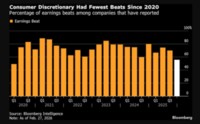권 회장은 16일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근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했다. 권 회장은 "국민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조기에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취임 후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는 도중에 터진 계열사의 비자금 문제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준양 전 회장과의 분명한 선 긋기를 통해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검찰은 포스코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수색에서 국외 건설사업 관련 내부 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해외법인 임원이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을 비롯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정 전 회장은 공격적인 M&A(인수합병)로 포스코의 몸집을 키웠다. 정 전 회장 재임기간 중 36개였던 계열사는 2012년 71개로 늘었다. 매출 규모도 2008년 41조7426억원에서 2012년 63조6041억원으로 22조원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마구잡이식 M&A로 인해 시장의 의문을 받기도 했다. 성진지오텍과 대우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이다. 플랜트 설비업체인 성진지오텍은 2009년 부채 비율이 1613%에 이를 정도로 부실한 기업이었다. 회계법인도 기업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지만 인수를 강해했다. 이후 2013년 포스코플랜택과 합병했지만 적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인수할 당시 가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으로부터 3개월 평균 주가인 8300원의 곱절에 달하는 1만6330원에 주식을 인수했다.
대우인터내셜의 인수 때도 경쟁사보다 2000억원을 더 적어내 적정 가격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인수될 당시 부채비율이 353.5%에 달해 부실 기업 인수 비판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당시 업계에서도 가격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뜸했다.
커진 규모에 비해 체력은 떨어졌다. 2008년 17.2%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7%로 급하락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포스코그룹이 떠안게 된 부채 역시 2008년 65.2%에서 2012년 86.8% 늘었다.
포스코의 재무건정성 악화가 비단 외연 확장으로 인한 결과로만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심화로 제품값이 내려간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98만6000원이던 탄소강 판매가격은 2012년 1분기 92만9000원, 3분기 87만7000원으로 연달아 하락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시 철강산업의 수요처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으며 업황이 불황을 맞았다"면서 "중국, 일본 등 수입산 철강이 증가하던 시기"라고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 건설 등 철강 수요처들이 불황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요가 줄었다"면서 "당시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너진 포스코의 위상 회복이다. 권 회장은 내실경영 강화를 통해 포스코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 본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열사는 매각할 수 있다는 자세다. 작년에는 포스코특수강을 세아그룹에 넘기기도 했다.
권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작년 포스코특수강까지 매각했다"며 "그 같은 감각을 가지고 올해 사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정 전 회장 색깔 지우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취임 초기부터 있었다"면서 "기업의 경영이라는게 딱 자르고 말고 할게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