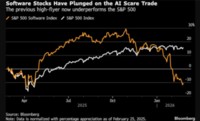[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올해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 향후 10년 이내에 유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도한 부채와 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으로 성장이 급격히 막히면서 이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진단이다.
결국 구제금융 등을 지원받는 가운데 구조조정 속에서 유로존을 탈피해 자국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을 거쳐 수출 등으로 회복력을 받는 시나리오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전망이 유로존 국가가 아니고 유럽의 신재정협약 등을 반대하고 있는 영국의 싱크탱그와 언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로존 중심국의 입장은 그리스 등의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유럽 내 갈등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영국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은 10년 이후 유로화가 폐지될 가능성이 99%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2012년이 유로존 붕괴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EBR의 더글러스 맥윌리엄스 최고경영자(CEO)는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유로존에서 최소한 1개 회원국이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은 거의 확실시되며, 이탈리아 역시 잔존보다 탈퇴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두 회원국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과격한 긴축에 따른 성장 저하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악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성장 저하로 인해 부채 현황이 더 악화될 공산이 크고, 결국 이는 유로존 붕괴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유로존의 해체는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가디언은 유로존 주변국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2012년은 유로존에 절박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잃어버린 10년’이 향후 지구촌 경제를 덮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스테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유로존 경제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지난 연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이 이미 진행중일 수도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