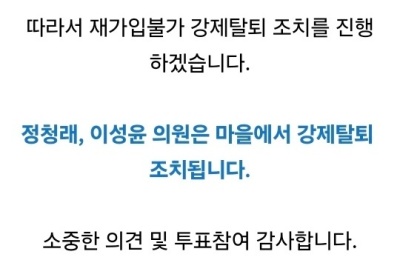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뉴스핌=김나래 기자]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주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막을 방법이 소송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2011~15년)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은행공동망에서 미반환금액 총액이 지난 5년간 3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1년에 570억원이었고 2012년 557억원, 2013년 865억원, 2014년 689억원, 2015년 836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은 은행공동망에 이에 대한 접수와 함께 사유를 기록하는데 이 중 수취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난 5년간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연락에도 수취인이 답을 하지 않는 고객무응답 사유와 수취인 연락두절까지 포함하면 900억원이 넘어선다. 건수로는 총 4만5969건으로 피해금액은 한 사건당 197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만1771건(102억69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21억9940만원(7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해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인지했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대금회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착오송금 계좌를 지급정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착오송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진 않지만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수취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이라도 동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 역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원들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