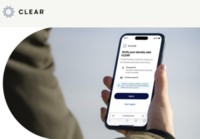與 "야당 발목잡기 이제 그만" vs 野 "관행대로 법사위원장 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누가 갖느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위한 최종관문이다. 국회법 86조 1항은 각 상임위가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법안이 기존 법률이나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라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셈이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본래 목적인 체계·자구 심사 수준을 넘어 법안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논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야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으로선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법사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행이 이번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게 통합당 측 주장이다. 16대 국회까진 여야 관계없이 다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으나 17대 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한나라당에 법사위를 양보했다.
반면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이번에는 야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상당한 '패스트트랙 진통'을 겪었던 터라 더 이상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는 8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도 남아있다. 남은 쟁점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쪽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원구성 협상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은 오는 8일이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통합당과 협상을 이어가되 법정시한을 넘기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며 "일정대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운영에 있어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은 원칙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 국회 운영 룰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에선 유력 법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 3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된다.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역임, 남은 사법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면 4선 김기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 역시 판사 출신이면서,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오는 7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배석 하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 "빠른 시일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