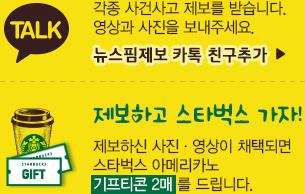[서울=뉴스핌] 김기락 사회부장 = 수험생 아빠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동네 보습학원을 보냈다. 맞벌이 가정이어서 아이가 하교 후 갈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녁께 아내가 퇴근해 보습학원에서 아이를 데려갔다.
중학생이 돼서 공부를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았다. 과목별 성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2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 당시 아이한테 공부로 스트레스를 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성적이 과목별로, 또 시기별로 들쑥날쑥하기 시작했다. 학부모로서 사교육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입시 전문 학원 등에 보내야 하나'. '남들은 중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등 생각이 스쳐갔다.
사교육을 3년 정도 시켜본 결과, 여전히 안갯속을 걷는 것 같다. 학교 수업의 질이 턱없이 부족해 사교육으로 채우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학교 수업만으로도 일정 수준이상 학습이 가능한 점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늘봄학교 대상 학년이었던 초등 1학년의 사교육비는 1년 만에 12.2% 급증했다.
특히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많았던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20만5000원으로 가장 적어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했다.
'웃픈' 것은 통계에 나온 67만1000원으로 사교육을 과연 몇 과목이나 할 수 있을까? 길 가는 수험생에게 물어봐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67만원'이다. 때문에 실제 사교육 시장은 추산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일 게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사교육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면 사교육이 과연 사라질까. 사교육이 사라져야 공교육이 바로 설까? 입시를 치른 이후의 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학 교육 이후, 20대의 삶 역시 교육과 떼어놓고 보긴 어렵다. 한 사람의 인생이 결국 교육으로 모아지는 셈이다.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농사를 짓는 데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100년 계획 보다는 10년의 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10년 후인 2036년 수험생은 지금의 수험생 모습과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새 교육부 장관의 막중한 과제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9월 모의평가(모평)일이다. 시험에 벌벌 떨 큰 애 얼굴이 떠오른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