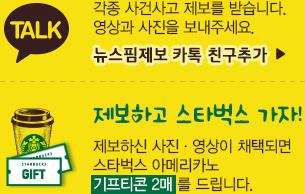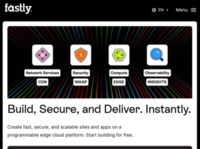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국내 모델 장점은 해상도와 예보 선행시간...자체 기술력은 필수"
[제주=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더 정확한 기상 예측의 길이 열렸다. 현재 국내 기상 예측 AI 역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기후 AI 글로벌 테크 포럼(AINPP)' 워크숍을 열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AI 기상예측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AINPP는 WMO(세계기상기구)의 인공지능 초단기예측 시범 프로젝트로, 2023년 시작해 2027년까지 진행된다. 상호검증을 통한 최적의 모델로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에 포함돼 있다.

이혜숙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 나우알파만의 장점을 '해상도와 예보 선행시간'으로 꼽았다.
이 과장은 민간기업 등이 기상 예측 AI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기상기후는 일반 국민의 재산 생명과 관련돼 있어 자체 기술력을 갖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며 "우리 쪽에 맞게 모델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존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국립기상과학원에 인공지능예보연구팀을 신설하고 2020년에는 기상청과 카이스트 간 기상분야 AI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상·기후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AI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인 '나우알파'를 자체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간 시험 평가 후 올해 5월부터 현업 운영중이다.
나우알파는 생성형 AI 기반의 강수패턴 추출 모듈과 트랜스포머 기반의 강수예측(6시간) 모듈로 구성돼 있다. AI가 어떤 것들을 참조해 결과를 내놓았는지 알 수 있는 설명형 가이던스 기능도 개발중이다.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AI를 통한 기상 예보 성능은 비슷해졌는데 이상기온이나 이상현상 학습은 데이터가 적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며 "예보관들이 왜 이렇게 예보를 했나 확인하고 AI가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도와주는 걸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수치 모델과의 차이에 대해 "인공지능의 큰 장점은 계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자원 양도 가볍고 답 내놓는 속도가 빨라 예보관에게 빠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며 "위험기상들은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초단기 예측 가이던스가 필요한데 수치 모델은 계산시간이 오래 걸려 수시로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모델을 하나씩 돌려서 알 수 있던 기존 수치 모델과 달리 AI는 학습한 것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다.
다만 AI가 예보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우 통보관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려면 예보관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예측 모델이 중기, 단기, 장기로 가더라도 수치 모델을 배제하고 이것들만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 역시 "AI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수치모델을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보조해 오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우리나라는 초단기 예보를 6시간 전에 하는 것을 타겟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