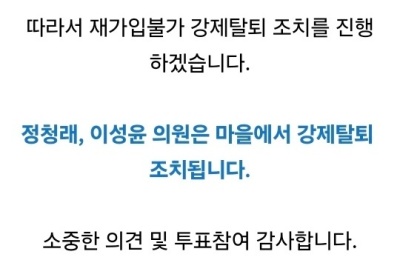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이 "채 상병 순직 당일 오전 현장 지침이 '수변 수색'에서 '수중 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5일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질 당시 포병여단 11 대대 20 중대장(대위)이었던 김모 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직속 상관인 최진규 당시 포 11대 대장(중령)을 통해 하달된 수색 지침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김 대위는 2023년 7월 18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지침을 전달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물살이 엄청나게 셌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해도 실종자를 찾으라는 게 시체를 찾으라는 건데 미리 교육도 안 됐었다"고 말했다.
이후 2023년 7월 19일 오전 현장에서 김 대위는 최 전 대대장으로부터 "(물살을 보고)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무릎 아래나 허리 높이까진 들어가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수색 지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대위는 "상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대 신문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장화 높이 수색 지침을 수중 수색으로 이해한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김 씨는 "하천 바닥이 모래였고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든 움푹 파일 수 있는 지형이었다"며 "아무리 얕은 곳이라도 언제든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일 밤 하달된 바둑판식 수색 지침도 수중 수색으로 이해했다며 "수변에 있어도 바둑판식으로 하면 대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다 보니 무릎 아래까지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지형에 맞춰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씨는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중 수색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위에게 수색 상황과 성과 압박 정황을 물었다. 재판부는 "중대장은 소속 대대장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보병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보병에서 (실종자를) 찾았기 때문에 14일 휴가를 받았고, '이를 얘기해 부대원 사기를 높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대원 교육 과정에서 '보병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을 했느냐"고 묻자 김 대위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색을 독려했느냐"는 질문에는 "열의를 가지고 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