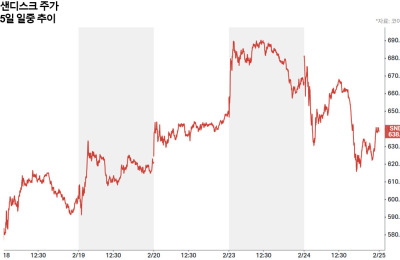[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군의 부실수사로 미제로 남겨진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살해 도구를 분실하고 그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과실이 중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부대 회식 후 같은 부대 준위 A씨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B씨와 별도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염 상사는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고, 근처 하천 자갈밭에선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대추나무 가지가 발견됐다.
사망 현장에서 약 1m 떨어진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각각 A씨와 B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당시 A씨와 B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헌병대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이들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 2대도 수사단서로 효력이 없다고 보고 단서에서 제외했다. 대추나무 가지는 헌병대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했다.
이후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재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A씨와 B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염 상사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B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검찰에서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염 상사의 유족들은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